전통과 현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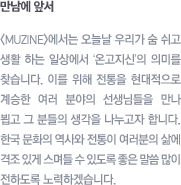
5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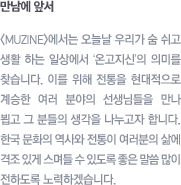
여름의 찌는듯한 공기 속,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 물줄기가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려 준다. 넓은 평야를 쉬이 따라가다 보면 ‘정관채 전수관’이라는 이정표가 반긴다. 전수관 앞 항아리, 겹겹이 쌓인 석회 껍질, 무성한 쪽이 염색장 정관채가 머무는 공간임을 알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정관채 선생은 태어나고 자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샛골에서 오묘하고도 어머니 마음처럼 깊이가 있는 ‘쪽빛’의 아름다움을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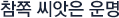
정관채 선생은 대학교 1학년이던 1978년 당시 목포대 박복규 교수로부터 쪽 씨를 받았다. 쪽 씨가 우리 땅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쪽’이라는 걸 들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처음 본 것이다. 그의 고향인 나주는 쪽물 염색이 발달한 곳이다. 예로부터 영산강은 홍수가 나기 일쑤여서 물에 강한 식물을 벼 대체 작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고 쪽은 그 중 하나였다. 쪽물 염색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이다. 그의 집안 역시 쪽물 염색을 가업으로 이어가는 것을 알게 된 교수가 그에게 쪽 농사를 맡긴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베틀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던 기억과 할머니가 덮어주던 쪽 이불에 대한 추억이 쪽과 운명처럼 만나면서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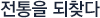
조선 시대 궁궐에 그림을 그리던 도화서처럼 염색을 전문으로 하던 도염서가 있었다. 신라 시대부터 염장 제도가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전통염색이지만 쪽물 염색은 한국전쟁 이후 사라졌다. 쪽은 일년생 풀로 한 해만 심지 않아도 씨를 구하기가 힘들다. 귀한 쪽 씨를 받게 된 그는 젊은 시절 쪽 농사를 하고 쪽물을 들이며 살아온 할머니와 부모님의 경험에다 그 모습을 보며 성장해온 자신의 체험을 더해 대학 졸업 무렵 쪽 재배에 성공했다.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포기할 수 없었다.

봄에 씨앗을 뿌려 충분한 햇볕, 바람, 물이 있어야 좋은 쪽을 얻을 수 있다. 6월쯤 쪽이 다 자라면 꽃이 피는데 그 전에 수확해야 한다. 쪽 잎이 무성할 때 색소가 있기 때문이다. 수확하기 시작하면 이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 세 시 반, 쪽대를 베어 항아리에 담고 물을 붓는다. 해가 뜨기 전 잎에 습기가 많을 때 쪽대를 베고 물에 담가야 쪽물이 잘 배어나기 때문에 요령을 피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이틀 정도 두면 잎에서 물이 빠져 나오고 거기에 굴이나 조개껍데기를 구워 만든 석회가루를 넣고 젓는다. 쪽물은 풀색을 띠다가 거품을 점점 내면서 붉은빛이 감돌기 시작하고 쪽빛 특유의 남색 물을 드러낸다. 천을 반복해서 물에 담그고 빼길 수십 번. 쪽빛이 물들어 간다. 담그는 횟수나 시간마다 그 색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과정 중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면 쪽물 염색이 수포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 게다가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 더 외로운 길이었지만 담근 손을 뺄 수 없었다.

대학 졸업 후 미술교사가 되어 교직에 몸을 담았지만, 쪽물 담그는 일을 멈출 순 없었다. ‘사서 고생한다’라며 힘든 일은 그만하라고 주변에서 모두 말렸다. 그는 “하나의 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염료는 극히 소량입니다. 해마다 쪽 농사를 짓고 쪽물을 들이는 과정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천연염색, 친환경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주목 받지 못한 터라 관심을 두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가치 있는 일이라 뿌듯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1995년 이후 천연염색이 부각되면서 섬유디자인, 공예를 전공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반인까지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쪽물이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전통 방식을 지키며 쪽빛을 물들인 지 20년. 그의 나이 마흔 둘, 국내 최연소로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이 되었다.

보랏빛이 들어간 푸른색, 그 쪽빛을 잠에서 깨웠다. 쪽물 염색을 원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가진 기법까지 전수하며 전통의 아름다움이 퇴색되지 않게 이어간다. 또한 유엔본부 초청 대한민국명품전시회 등을 통해 세계 많은 이들에게 한국 고유의 전통 색을 알리는 데도 여념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이들이 쪽빛을 보며 어찌 이런 색을 낼 수 있느냐며 감탄을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라며 잠시 회상에 잠긴다. ‘정관채 전수관’ 앞마당에 쪽빛으로 물들인 천이 상쾌한 바람을 타고 하늘 위로 부대끼는 모습이 숨결처럼 부드럽다. 올 여름에도 많은 이들에게 쪽 염색을 전수하면서 쪽빛 물 들이기에 여념 없을 그의 두 손에 배인 쪽빛은 더 진해져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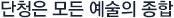
염색장 정관채 선생이 우리 문화재 중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단청이다. 목조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보면 그 색에 매료된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그려진 전통 문양을 보면 ‘멍’ 해집니다. 특히 사찰에서 만나는 단청은 세월이 지닌 멋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나무를 비바람이나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칠하는 것이지만 그 색 역시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조화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고유의 색이라 더 애착이 간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