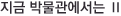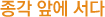하늘과 주변, 정자까지 모두 표면에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거울 못을 따라 오른쪽으로 난 길로 접어들면 야외 석조물 정원이 있다.아직은 초록의 기운이 없어 세월의 색을 입은 석탑과 배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연인들이 이 길을 걸으며 새삼 유물 사이를 걷는다는 것에 감탄하기도 한다. 곧 한낮의 기온이 오르고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봄이 올 것이다. 아끼는 사람과 박물관에 들어서며 석조물 정원을 산책해보자. 굽이굽이 난 길을 걸어 전시실 외벽에 다다르면 정면 오른쪽 에는 석등과 탑비가 보인다. 천천히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이 길을 거쳐 전시를 보러 가는 것은 어떨까?
3월이 되면 겨우내 웅크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다. 새해가 되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진정 새로운 해구나’ 하고 느낄
때쯤 우리는 그렇게 봄이 왔음을 깨닫게 된다. 새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들이 흩어져 흔적 없이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이 시기에는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짧은 교외로의 소풍을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멀리,작정
하고 떠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봄이 오면 보다 가까운 산책로를 찾게 된다. 여기, 도심에 있으면서 세월을 넘나드는 유물이 함께하는 멋들어진 산책로가 있다. 굽이진 박물관 야외정원 길을 따라 조성된 석조물 정원이 바로 그 곳이다. 그리고 전시실을 향해가는 길에는 석등과 석비가 있는 휴식 공간이 있으니 이 봄, 산책하기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

석조물 정원 방향으로 접어들면 여러 개의 탑들이 펼쳐진 풍경이 처음 눈에 들어온다. 어느 절터에 가더라도 이처럼 여러 가지 탑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먼저 산책자를 맞이하는 탑은 국보 100호인 남계원 칠층석탑
(南溪院 七層石塔)이다. 이 석탑은 경기도 개성시 덕암동 부근의 남계원 절터에 있던 것을 1915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왔고 2005년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운 것으로, 발굴지점을 재조사하여 발견된 기단부의 잔석(殘石)은 따로 옮겨왔다. 이는 탑의 전면에 서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기단부와 탑신부의 마모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전체적으로 계획된 비율이나 화려한 면모는 없으나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탑신의 지붕돌 네 모서리의 살짝 들린 모양이 그 무게를 덜어주는 듯하다.

이 탑의 오른쪽의 김천 갈항사 터 동· 서 삼층석탑(金泉葛項寺址東西드層石塔)은 서로 규모와 구조가 같으며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성을 보인다. 지대석과 탱주의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며 기단의 네 모서리에는 기둥을 새겨 넣었고, 기단부에 새겨진 글을 통해 탑의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 수 있다.동일한 세부묘사의 두 탑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안정감을 준다.
다소 무딘 느낌의 묵직한 형태를 보여주는 홍제동 오층석탑(弘濟洞 五層石塔)은 몸돌의 하단이 다른 석탑과는 다소 다르게 생겼다. 몸돌에는 목조건축의 형태를 닮은 액자모양을 새겼고 지붕돌의 사방 끝은 치켜 올라가며 두께가 늘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있다. 이 탑을 마주하고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高達寺 雙師子 石燈)이 보인다. 이 석등의 특이점은 두 마리 사자가 불발기집(火舍石)을 받치고 있는 형태에 있다. 사자가 서서 화사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엎드려서 먼 중앙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감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발굴부터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부분이 따로 옮겨오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이 석등은 지붕돌이 파손되어 절반만 남아있었으나, 2005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그재그처럼 이어진 이 석탑들이 위치한 산책길은 이 외에도 천수사 오층석탑(泉水寺 五層石塔)과 삼층석 탑(泉水寺 三層石塔),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형태의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原州令傳寺址普濟尊숍숨利塔)등으로 이어지며 산책자를 이끈다. 그 끝에는 갈림길이 있고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마치 다른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미르폭포 앞에 다다른다. 아담한 크기의 못과 낮은 폭포는 전체적으로 이름에 비해 친근함을 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이다.
다소 무딘 느낌의 묵직한 형태를 보여주는 홍제동 오층석탑(弘濟洞 五層石塔)은 몸돌의 하단이 다른 석탑과는 다소 다르게 생겼다. 몸돌에는 목조건축의 형태를 닮은 액자모양을 새겼고 지붕돌의 사방 끝은 치켜 올라가며 두께가 늘어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있다. 이 탑을 마주하고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高達寺 雙師子 石燈)이 보인다. 이 석등의 특이점은 두 마리 사자가 불발기집(火舍石)을 받치고 있는 형태에 있다. 사자가 서서 화사석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엎드려서 먼 중앙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감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발굴부터 현재의 위치에 오기까지 부분이 따로 옮겨오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이 석등은 지붕돌이 파손되어 절반만 남아있었으나, 2005년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그재그처럼 이어진 이 석탑들이 위치한 산책길은 이 외에도 천수사 오층석탑(泉水寺 五層石塔)과 삼층석 탑(泉水寺 三層石塔),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형태의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原州令傳寺址普濟尊숍숨利塔)등으로 이어지며 산책자를 이끈다. 그 끝에는 갈림길이 있고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마치 다른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미르폭포 앞에 다다른다. 아담한 크기의 못과 낮은 폭포는 전체적으로 이름에 비해 친근함을 준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장소이다.
다시 거울 못을 따라 보신각종이 있는 방면으로 걷다 보면 능을 지키는 석조물인 문인석(文人石), 돌로 만들어진 양(石羊), 석함(石函)을 만나게 된다. 그 끝에 묘 앞을 밝히는 장명등(長明燈)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소박하고 얕게 조각된 두 부처입상이 서있다. 수인(手印)과 표정이 희미하지만 온화한 느낌으로 산책자와 마주하는 부처상에서 벗어나 다시 장명등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에 옛 보신각 동종(舊普信閣銅鍾)이 묵중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619년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보신각에 옮겨져 오전 4시에 33번, 오후 10시에 28번을 울려 도성의 문을 여닫는 일과 하루의 시각을 알리는 데 쓰였던 이 종은 1986년 안전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오랜 시간 시민의 하루를 알려왔던 이 종은 조용히 쉬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담백하고 위용이 가득한 모습이다.

보신각종을 등지면 건물로 이어지는 계단 길에서 석등의 지붕돌이 시선을 끈다. 전라남도 나주 읍 성터 서문 안의 절터에 파손된 채로 남아 있던 것을 옮겨온 나주 서문 석등(羅州 西門 石燈)은 지붕의 처마 밑 드림 장식과 추녀 끝에 새겨진 꽃무늬 등이 장식적인 특징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단아하고 격조 있는 형태를 지닌다. 건물 외벽을 따라 조성된 승가탑 거리를 가다 보면 다소 성글게 구성된 듯 보이는 현화사 석등(玄化寺石燈)이 있다. 이 석등을 상세히 살펴보면 상륜부나 화사부에 다양한 꾸밈이 있지만, 두어 걸음 떨어져 보면 전체적인 균형감이나 비율이 썩 훌륭하진 않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상륜부는 현화사가 당시 국가적인 대찰(大刹 : 큰 규모의 절)로 창건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기술적인 미진함 때문이 아니라, 장인의 미감이 반영된 까닭이 아닌가 생각한다. 석등 앞에는 윗면에 도드라져 보이는 연꽃이 새겨져 있는 배례석(拜禮石 : 불전을 참배할 때 향료와 촛대 등 의식 용구를 배치하였던 돌)이 함께 있다.
현화사 석등에서 등을 돌리면, 높고 긴 동관의 외벽을 따라 승가탑 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앞에는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한낮의 기온이 제법 높아지는 요즘은 볕에서 얻은 온기를 머금은 자리에 앉아 탑과 탑비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다.
현화사 석등에서 등을 돌리면, 높고 긴 동관의 외벽을 따라 승가탑 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 앞에는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한낮의 기온이 제법 높아지는 요즘은 볕에서 얻은 온기를 머금은 자리에 앉아 탑과 탑비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좋다.

동관의 전시장 입구를 향해가면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은 흥법사 진공대사 탑과 석관(興法寺眞空大師塔附石棺)이다. 이 탑과 석관은 평범한 형태지만 전체적인 균형과 꾸밈에서 품격이 느껴진다. 진공 대사가 고려 태조가 친히 비문을 지을 정도로 대접을 받는 왕사였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왕명에 의해 당시로서 가장 우수한 석공이 제작하였을 것이다.
승가탑 길의 유일한 탑비인 보리사 대경대사 현기탑비(楊平菩提寺址大鏡大師塔碑)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활약한 승려 대경대사의 업적을 새긴 탑비이다. 탑비를 받치고 있는 거북 돌의 머리는 보주를 물고 목을 세운 용머리 모습인데 깨어진 것을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이 부분은 탑비 전체로서의 균형을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구름과 용이 매우 역동적이며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미감이 뛰어나다.
현재 기단 밑 부분과 상륜부가 없는 국보 104호 염거화상 탑(傳興法寺廉居和尙塔)은 표면꾸밈이 생각보다 더 다채롭다. 기단부에는 사자모양, 안상무늬, 연꽃무늬 등이 새겨져 있고, 몸돌에는 안상무늬와 천부상(天部像), 사천왕상 등이 있다. 낙수 면의 기왓골과 지붕돌 의 서까래, 몸돌의 문 장식과 어우러져 건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염거화상 탑을 시작으로 이후의 부도들이 팔각원 당형을 기본 삼았다고 한다.
승가탑 길의 유일한 탑비인 보리사 대경대사 현기탑비(楊平菩提寺址大鏡大師塔碑)는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활약한 승려 대경대사의 업적을 새긴 탑비이다. 탑비를 받치고 있는 거북 돌의 머리는 보주를 물고 목을 세운 용머리 모습인데 깨어진 것을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이 부분은 탑비 전체로서의 균형을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구름과 용이 매우 역동적이며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미감이 뛰어나다.
현재 기단 밑 부분과 상륜부가 없는 국보 104호 염거화상 탑(傳興法寺廉居和尙塔)은 표면꾸밈이 생각보다 더 다채롭다. 기단부에는 사자모양, 안상무늬, 연꽃무늬 등이 새겨져 있고, 몸돌에는 안상무늬와 천부상(天部像), 사천왕상 등이 있다. 낙수 면의 기왓골과 지붕돌 의 서까래, 몸돌의 문 장식과 어우러져 건축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염거화상 탑을 시작으로 이후의 부도들이 팔각원 당형을 기본 삼았다고 한다.

이제 승가탑 길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박물관 정문으로부터 거울 못을 따라 석조물 정원을 산책하고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 미르폭포를
본 후, 다양한 석물이 좌우로 지켜주는 길과 동관 건물 외벽을 따라 쉬엄쉬엄 걸어왔다. 이렇게 석조유물과 자연이 어우러진산책길에는
각 유물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도 있어 우리나라 석물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봄기운이 짙어지면
더 오랜 시간, 더 찬찬히 머무르며 산책할 수 있을 이 길을 다시 산책하기로 한다.